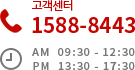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외숙모의 꽃밭 |  | |
| 며칠 전 외가에 다녀왔다. 불현듯 외숙모가 보고 싶었다. 외숙모는 그곳에 혼자 사신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시고 외삼촌이 외숙모와 함께 살고 계셨다. 외사촌 석규 형과 정숙이, 정란이도 있고 방학이면 외삼촌의 다섯 누이가 시집가서 낳은 열아홉 명이나 되는 외손들이 시골집을 찾아오는 바람에 늘 붐비던 곳이었다.
그러다 어느 해인가 외할아버지가 초파일날 찬물로 머리를 감다 돌아가셨다. 그 뒤 석규 형은 장가를 들어 서울로 분가하고 정숙이, 정란이도 서울로 떠났다. 한참 뒤 새하얗게 늙으신 외할머니가 노환으로 세상을 뜨셨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외삼촌도 갑자기 중병이 들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옛날에 외가에 가 보면 마당을 빙 둘러 온갖 꽃들이 만발했다. 유달리 화초를 좋아하는 외할아버지가 부지런히 심고 가꾸신 까닭이었다. 오동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탱자나무, 무화과나무에 목련, 철쭉, 백일홍, 영산홍, 붓꽃 등속에 내가 모를 온갖 화초들까지. 내 유년의 외가는 꽃 천지, 나무 천지였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아프시면서 몇 년 전에 가 본 외가 풍경은 말이 아니었다. 꽃밭에 화초들은 제멋대로 자라 서로 엉켜 볼썽사나웠다. 나는 그날의 가슴 아픈 풍경을 떠올리며 고개를 넘어 저 아래 보이는 외가를 향해 내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선 외가는 마치 꿈속처럼 옛날의 아름다움 그대로였다. 꽃밭이며 마당이며 온통 윤기 나는 화초들의 향연장이었다.
놀라움 속에 나는 외숙모를 불렀다. 처음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더니 얼마 뒤에 대청마루 위 방문이 슬며시 열리다가 ˝이게 누구여!˝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방문이 활짝 열렸다. 외숙모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다. 외숙모가 외가를 지키고 계셨다. 시부모와 남편이 세상을 뜨고 자식들은 서울로 떠나 쓸쓸한 그곳을 함뿍 연로해진 외숙모가 마지막 주인이 되어 아름답게 가꾸고 계셨다.
내 옛날의 외가가 그렇게 풍성했던 것은 외숙모의 숨은 정성 덕택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을 나는 외숙모 혼자 외가를 지키고 계신 오늘에야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되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