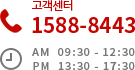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시한부 환자들의 ‘臨終친구’ |  | |
| 신촌세브란스 ‘호스피스 대상’ 박영자씨…시한부 환자들의 ‘臨終친구’
2000년 1월 30일. 오늘따라 밥을 먹지 않겠다고 생떼를 쓴다.죽음에 대한 공포가 삶
의 의욕마저 꺾은 것일까.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
이 아팠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0년째 호스피스로 자원봉사를 해 온 박영자씨(65·서울 고척
동)가 간호했던 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일기중 일부다.
박씨는 1999년 7월 그를 돌보기 시작,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날때까지 8개월동안의 병
상기록을 수첩에 깨알같이 남겼다. ‘2000년 2월 13일. 그도 하나님 곁으로 갔다.죽
을 때까지 곁에 있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기에는 또 한 환자를 떠나보내는 안
타까운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박씨는 지난 6일 열린 신촌세브란스병원 호스피스 14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한햇동안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2000 호스피스 대상’을 수상했다. 그녀가 지난
해 에이즈 등 말기환자들과 함께 한 시간은 무려 1820시간. 수상자 36명중 1000시간
을 넘긴 이는 그녀가 유일하다. 환자수만 해도 120여명, 지난 92년부터 합치면 무려
600여명에 이른다.이중 80%는 세상을 떠났다.
“함께 한 시간이 몇 개월에 불과할 때가 많았지만 얼굴은 전부 기억합니다”
환자들과 찍은 사진들,3권의 병상수첩은 그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
이다. 5년전 한 지하 전셋방에서 숨을 거둔 세 아이의 엄마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아홉 살 난 둘째 아들이 자궁암 환자인 엄마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그 집 아이들
의 저녁을 챙겨주고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우산을 내팽개치고 하염없이 울었었다.
남편과 함께 쌀집을 운영하는 박씨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식사만 챙겨주면 거의 빠짐
없이 병원으로 향한다. 하루 평균 5∼6시간 일하지만,환자의 상태에 따라 하루나 이틀
을 꼬박 같이 보내는 경우도 허다했다. “저라고 왜 힘들거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
음먹기에 달려 있지요”
박씨의 환자 사랑은 병원밖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초 모 백화점 ‘소원들어주기’
경품이벤트에 우연히 공모했다 당첨돼 받은 1000만원을 환자들을 위해 써 달라고 병원
에 기꺼이 내놓았던 것. 이미 안구와 시신도 기증해 두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병들지 않은 육신을 남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
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가족들의 무관심과 냉대가 가장 안타까웠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박씨는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반겨 줄 사람들이 많아 외롭지 않을 거예요”라며 소박하게
웃었다.
(국민일보에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