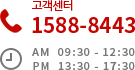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내 |  | |
| 뒤를 돌아봐, 거기엔 웅크린 불행이 있어!
마음을 할퀴고 지나간 각종 사건들, 삼류 비디오 테입처럼 예고편도 없이 찾아와 신문을 장식하는 그런 사건들은 찾아올 때보다 더 재빠른 속도로 꼬리를 감춘다. 사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을 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데에 집착하고 있지 않다. 구경꾼들은 그저 시간과 더불어 잊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걸까? 쉽게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하성란의 세 번째 소설집 「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는 그렇게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다. 작가가 헝그리 복서 김득구의 마지막 고통과 외로움으로 말문을 여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르겠다. 총 11편의 단편이 실린 이 책에서 작가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상의 이면에 도사린 비일상, 그 불행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실재했던 사건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법한 일이기도 하다. 작가 하성란은 현미경처럼 꼼꼼히 들여다보거나 기억하거나 혹은 예견하면서, 특유의 섬세하고 민첩한 묘사로 사각사각 그려나간다.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를 다룬 ´별 모양의 얼룩´이라든가, 80년대 초반 온 나라를 총알받이처럼 들쑤셔 놓았던 우순경 총기난사 사건을 소재로 한 ´파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별 모양의 얼룩´에서는 1999년 6월의 씨랜드 화재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살아남은 자들의 아픈 풍경을 핍진하게 담았다. 화재 사건이 난 1년 후, 부모들은 화재의 현장을 찾는다. 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모들이 태반이지만 그래도 1년 전과 달리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소읍의 한 가게 주인이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 말로 인해 이들 사이에는 다시 술렁임이 시작된다. 불이 나기 직전 ‘노란 옷을 입은 꼬마 하나’가 가게 앞을 지나간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 혹시 내 아이가 아니었을까, 어딘가에 내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닐까.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파리´에서는 1982년 경남 의령에서 있었던 우순경 총기난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소재와 정황을 통해, 과연 그는 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추적해 나간다.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과 그로 인해 주인공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외로움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안개와 더불어 을씨년스럽게 묘사된다.
“삼년 째 이 장에 오지만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마을엔 개가 별로 없다는 것 아세요? 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외부인이 오면 이 마을 전체가 커다란 개가 되니까요. 전에 이곳에 서울서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이 있었죠. 결국 그 사람은 더 깊숙이 들어가버리고 말았어요.”(p.79)
어찌 보면 주인공의 총기난사는 ‘커다란 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행동일 수도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우연히 낯선 이들 틈바구니에 들어가 도무지 열릴 줄 모르는 그들의 세계에서 고군분투하게 된 주인공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시사하면서 작가는 그도 사실은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앞의 두 작품이 이미 있었던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다가올(지도 모르는) 불행이다. 서른 두 살의 노처녀인‘나’는 세살 연하인 뉴질랜드 교포 제이슨과 만난 지 삼 개월만에 결혼을 하고 뉴질랜드로 떠난다. 빈틈없는 매너, 수염을 파르스름하게 깎은 제이슨은 알고 보니 고질적인 동성연애자였고, 이 사실을 알아버린 ‘나’는 남편 제이슨에 의해 오동나무 옷장에 갇히게 된다. 문제는 ‘나’의 아버지가 손수 기른 오동나무로 만든 옷장이 하마터면 그녀의 관이 될 뻔했다는 데에 있다. 든든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의 상징이었던 오동나무 옷장. 그것은 순식간에 불행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서른 두 해를 기다려온 결혼이 열 아홉달 만에 어이 없이 끝나고, ‘나’는 이렇게 반문한다.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p.60)
행복과 불행은 이처럼 한끝차이로 우리 곁을 맴돈다. 타나토스와 리비도가 사이좋게 공존하면서 삶을 이루듯, 일상 역시 그 이면에 도사린 어두운 그림자가 없다면 더 이상 일상일 수 없다. 불행은 종종 일말의 개연성 없이 일상에 틈입한다. 그나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 한순간 닥친 불행을 곧잘 망각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이현희 imago@libro.co.kr/리브로)
by http://www.libro.co.k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