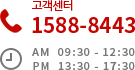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오영수의 어린상록수 |  | |
| ‘여기 사람 여기 농민’이 되고 싶었던 내 아들에게
여기 한 편의 풋풋한 소설이 있다. 「갯마을」의 작가 오영수가 1975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이 소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박하고 단정한 소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에 1970년대라는 시대적 공간은 너무 ‘험했다’. 때문에 농촌으로 내려가 황무지를 일구면서 살고만 싶었다는 저자의 아들 오건이 땅으로 돌아가 땀 흘리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은 어쩌면 조금 밍숭맹숭하고 조금은 사변적이어서 시시하게 여겨졌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가?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어쩐 일인지 하마터면 영원히 기억 속으로 틈입하지 못할 뻔한 이 소설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작가 오영수 선생의 둘째 아들 ‘건’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 소설은 아들의, 아들을 위한, 아들에 의한 소설이다. 오영수는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 ‘애비도 에미도 형도 동생도 닮지 않은 엉뚱한’ 녀석이라고 지칭하며 말문을 열지만, 정작 이 소설에는 척박한 농촌 환경을 일구겠다며 리어카 하나만을 혼수품으로 받아들고 황무지로 떠나간 아들 오건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담뿍담뿍 실려 있다.
그림과 문학을 좋아하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유난히 농사에 취미를 갖고 있었다는 오건은 10평 남짓한 마당 한 켠에 별의별 채소를 다 키워 뜯어먹고, 병아리, 닭, 토끼 등 각종 가축들을 키워 동네에서는 ‘꼬마 가축박사’로 유명했다. 아버지 오영수는 그토록 우리 땅, 우리 농촌을 사랑하던 아들이 장성해 농대를 졸업하고, 결혼 후에는 황무지를 찾아 내려가 땅을 일구고, 벽돌로 손수 자신이 살 집을 짓고 종국에는 전라북도 부안지역 농민운동의 선구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백하게 그려낸다.
1970년대에 발표된 이 짧은 실화소설에서 어떤 문학적 기교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다. 저자는 단지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들의 행각을 때로는 기특하게 때로는 안타깝게 묘사할 뿐이며, 그런 가운데 독자인 우리는 어린 나이에도 마치 천성인듯 흙에 대한 애정과 집착을 보이는 ‘오건’의 일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감동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찾아 든다.
잔잔한 감동보다는 파격, 기교, 새로움만을 마치 무슨 콤플렉스처럼 자랑하는 문학작품이 난무하는 요즘. 가족과 상의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농대를 간다고 우기는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제대할 때까지 농촌 정착 자금으로 오십만원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두말없이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황무지에서 우직하게 살아나가는 아들이 이루어내는 풍경에 대한 소박한 서술은 ‘모름지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문학의 본령에 충실하려는 작가의 바람을 역력히 반영한다.
젊은 날의 꿈은 영 부질없는 것, 객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의 손에 굳이 들려주고만 싶은 이 소설은, 오건과 함께 농민운동을 했던 이들의 증언과 오건의 생전 모습, 그와 함께 한 리어카의 사진과 함께 더욱 진한 가치를 지닌다. “여기 우리들 가슴 속에 오래도록 살아 있을 농민 오건 잠들다”라는 묘비명이 무척 인상 깊다. (이현희 imago@libro.co.kr/리브로)
by 리브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