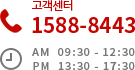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아리랑’과 ‘그네’ |  | |
| 파란 눈에 금발을 한 어느 외국 여인. 그 여인이 한국 노래를 부른다.
뭐, 요즘에야 그런 모습은 흔히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30년 전쯤으로 기억을 되감아 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자면? 또 그것도 부산 바닥에서라면?. 1970년 초반, 아직 연탄 불에
물을 데워 써야 했고, 버스 안내양들의 ‘오라이, 오라이’ 소리를 들을 수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시아인이신 우리 어머님은 자식 교육에 몸 바친 어머님이셨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지식을 넘겨 주시려는 듯 재잘거리는 딸 셋의 모든 질문에 서슴없이
답변했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감정을 우리에게 안겨 주고 싶어했다.
특히 어머님은 유난히 음악을 사랑하셨다. 미국에서 소중히 간직하며 챙겨온 LP 한장, 말러
교향곡 1번으로 밤이면 밤마다 딸 셋을 재우셨고, 빈 소년 합창단, 발레 등 중요한 공연이
부산을 거칠 때마다, 늘 우리에게 문화를 접하게 하려 이리저리 공연장을 끌고 다니셨다.
큰 언니는 커다란 키에 한국무용, 작은 언니는 개나리 합창단, 난 두 언니 따라 피아노와
무용을 한다고 딸 셋은 바빴다. 이렇게 우리 집안은 예술과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사실
노래만큼은 엄마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성악을 전공하다가 한국으로 오셨고,
또 우리 한국인 아버지를 만난 것도 뉴욕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엄마가 부른 ‘아리랑’ 에
아버지가 혹하고 빠진게 계기가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집안만의 ‘아리랑 전설’ 인데,
막내 딸인 나에겐 그 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엄마의 노래가 있다. 제목도 가사도 몰랐던
그 노래는 어린 내 귀에 “살며시 옷에 치마 랄랄랄라…” 라는 가사로 들렸다.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슬픈 곡조를 좋아 했는지… 난 엄마가 이 노래만 부르면 조용하게
듣곤 했다. 이 글을 쓰면서 사실 제목을 처음 뒤져 봤다. 금수현의 ‘그네’ 다. ‘살며시 옷에
치마’ 가 아니라 ‘세모시 옥색 치마’ 였다. 하하…왜 그리 잘도 부르셨는지. 외국 여자였지
팔도 민요, 가곡, 그리고 제일 좋아한 가수였던 이미자 노래까지 한국 노래를 많이도 알
았다. 그래도 난 엄마가 ‘세모시 옥색치마’ 를 부르기 시작하면, “음…저 분 울 엄니야”
라고 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큰 언니한테 ‘엄마의 노래’ 를 물어보니 두 번 생각지도 않고 당연히
‘보리밭’ 이라고 했다.) 아뭏든, 비디오는 외국인, 그러나 오디오는 한국 가곡으로 딸들의
추억을 가득 메운 우리 엄니였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