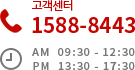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꽃다발 (정채봉) |  | |
| 꽃다발
- 정채봉 -
며칠을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둥과 번개가 쳤고, 강에서는 강둑이 터질 듯이 물 흐르는 소리가 크게, 크으게 들렸습니다.
어른들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모양이라고 야단들이었습니다. 한수는 어른들의 그런 말이 참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났다면 별들이 먼저 쏟아져 내려올 것이 아니냐고 자꾸만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하늘 어디에 있다가 한꺼번에 저렇게 길 없는 하늘 사이를 이어 오는 것인지, 비는 정말 놀랍고 신기로웠습니다.
한수는 새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침녘에 비가 좀 멎는가 하였는데 검고 두꺼운 구름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틈틈이 파아란 하늘이 내다보이고 미루나무 사이로 비껴드는 햇볕은 한결 싱싱했습니다.
처마 밑의 어미제비가 새끼제비를 모두 데리고 나가 앉아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하는 빨랫줄에는 파랗고 노란 옷가지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고추잠자리를 잡으러 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뒤뜰에서 길고 곧은 댓가지를 찾아 잠자리채를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 나가셨던 한수 어머니가 급히 사립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거 좋겠다. 이리 주라.˝
어머니는 한수의 손에서 댓가지를 잡아챘습니다.
˝엄니, 뭘 할랑가?˝
한수는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니는 몰라도 되는 것이여.˝
어머니는 댓가지 끝에 한수가 애써 매달아 놓은 그물 주머니를 떼어 버렸습니다.
한수는 금방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수의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댓가지 끝에 낫을 꽁꽁 매달았습니다.
마을 앞 샘에 어머니가 두레박을 빠뜨리셨나 보다고 한수는 짐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공일에 영희가 떨어뜨린 주전자도 건져 달래야지.
한수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벅수물 샘터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먹뱅이재를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곳은 동들 건너에 있는 강가였습니다.
강둑에는 마을 어른들이 망초꽃처럼 하얗게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수 어머니처럼 모두들 낫이나 갈퀴를 매단 기다란 작대기로 강물 위에 갈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강물에 춤추듯 굼실굼실 떠내려오는 물건들을 건지느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영철이 아버지는 커다란 통나무 세 개를, 민수 어머니는 함지 둘을 건져 놓고 있었습니다.
범일이 아버지와 용자 삼촌은 새끼돼지 한 마리를 앞에 두고서 서로가 자기네 것이라고 얼굴을 붉혀가며 우겨대고 있었습니다.
˝요 작대기가 쬐금만 길었으면 되는 것인디.˝
막 떠내려오는 고리짝을 보고 쫓아가셨던 어머니가 민수 어머니한테 밀려나고서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영철이 아버지가 반닫이 하나를 건져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물건이 하나씩 떠내려올 적마다 마을 어른들은 한 발이라도 먼저 물 속에 덤벼들려고 서둘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도 치마를 허벅지 위에까지 걷어올리고 강에 들어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한수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엄니, 들어가지 마소. 어이 엄니.˝
어머니는 한수의 손을 냅다 뿌리쳤습니다.
˝야가 어찌 이런다냐? 얼른 집에 안 갈래.˝
어머니가 하도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나무라는 바람에 한수는 뭐라고 말을 더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강물에는 풀잎을 덮어쓴 초가 지붕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와´ 함성을 질렀습니다.
지붕 뒤에 많은 살림살이들이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농이며, 평상, 경대, 절굿공이며 심지어 장고까지도.
물건들을 건져내느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어른들 틈을 벗어나서 한수는 홀로 강둑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노랑할미새가 한 마리 초롱초롱 울면서 한수의 곁을 스쳐갔습니다.
노랑할미새가 날아간 강 건너쪽에서 무지개가 아질아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둑 위로부터 어른들의 떠드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또 무슨 큰 물건이라도 내려오는가 보다고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둑이 무너져라 밀려오는 강물은 ´콸콸 우르르 콸콸´ 소리를 내면서, 높고 낮은 물굽이를 이루며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호주머니에서 낙서한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배를 접었습니다.
종이배의 돛에는 ´꿈´이란 글자가 뱃머리에는 ´바람´ 그리고 몸체에는 ´해´와 ´솔´이란 글자가 내다보였습니다.
꿈과 바람과 해와 솔이 적힌 종이배를 강물에 띄우려다 말고 한수는 강둑에서 강아지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풀을 종이배에 실어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강아지풀을 실은 종이배는 뒤뚱거리면서도 용케 넘어지지 않고 세찬 강물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떠내려갔습니다.
물살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러서도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이배를 한참 쫓아가던 한수는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아.
종이배가 스쳐간 물결 위로 붉은 꽃 몇송이가 한수쪽으로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수가 잠깐 꽃에 정신을 판 사이에 종이배는 어디쯤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종이배가 어디에 가든지 언제나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빌면서 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꽃에 닿기에는 한수의 팔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한수는 바로 옆 바위 가에 걸려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허리를 쭉 펴서 꽃이 있는 데로 나뭇가지를 뻗었습니다.
그런데도 꽃은 나뭇가지 끝에 닿을 듯 말 듯하면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조금씩 조금씩 발을 아래로 내디뎠습니다.
강물이 찰싹 한수의 발 밑을 쳤습니다. 뚫어진 고무신 틈으로 물이 흠뻑 스며들었습니다.
꽃은 물살에 떠밀려서 한수가 내민 나뭇가지 옆으로 비켜 가려고 하였습니다.
한수는 발뒤꿈치를 치켜들었습니다.
마침내 꽃이 나뭇가지에 살짝 걸렸습니다.
한수는 조심스레 숨소리조차도 죽이며 꽃을 제 앞으로 가만가만 끌어당겼습니다.
꽃은 작은 꽃바구니 안에 금방 누가 놓아둔 것처럼 꽃잎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꽃을 집어든 한수는 기쁨으로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꼭 누구한테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것마냥 기뻤습니다.
꽃바구니에는 물 밖으로 내다보이던 붉은 작약꽃 말고도 하얀 찔레꽃, 그리고 옥잠화가 한아름 묶여 있었습니다.
저 먼 어느 산마을의 이름 모를 동무가 놓친 것일까. 아니 작은 물줄기가 시작되는 마을에서 누군가가 떠내려보내 준 것일 거라고 한수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내려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한수는 몇 번이고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한수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다 사금파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하나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얼굴에 두 갈래로 머리를 땋은 여자 아이였습니다.
그림 하나가 또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동화책에서 본,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길게 입은 누나였습니다.
한수는 일어서서 그림을 보고 고개를 까닥 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깡총깡총 뛰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콩콩 뛰고 있는 가슴을 꽃다발을 안은 오른손으로 누르며 왼손으로 사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네 마당에는 웬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아버지도, 민수 어머니도, 그리고 범일이 아버지와 용자 삼촌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한수가 들어가자 모두들 한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한수는 급히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수는 어머니의 옥색 고무신이 한 짝 놓여 있는 곁에 제 고무신 두 짝을 나란히 벗어 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수의 신도 어머니의 신도 모두 물에 젖은 채였습니다.
˝엄니, 꽃 보소잉. 강물에서 건져 왔어.˝
안에서 한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 나왔습니다.
밖에 있는 어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는 온몸이 물에 젖어 누워 있는 어머니의 가슴 위에 꽃을 가만히 안겨 주었습니다.
˝쯧쯧, 뒤주 하나 건질라다가 하마터문 저리 귀한 아들 두고 죽을 뻔했군, 그래.˝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던 영희네 할아버지가 담뱃재를 털고 일어서며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