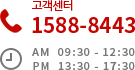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어느 술항아리의 꿈 |  | |
| 오랫동안 항아리며 도자기 그릇들을 구워 온 만들어 온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술항아리 두 개를 만들었다.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항아리였는데, 다만 그 몸통에 새겨진 무늬가 달랐다. 한 항아리에는 들꽃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항아리에는 하늘로 곧게 뻗은 대나무가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제자들을 시켜 항아리 둘을 양지바른 산기슭에 옮겨 놓게 하고는, 손수 맑은 물을 길어 와 두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
때는 봄이었다.
˝얘, 세상이 참 아름답지? 그 어두운 광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환한 세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난 세상에 태어 난 게 기뻐.˝
들꽃이 그려진 항아리가 말했다. 그러나 대나무가 그려진 항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얘, 넌 왜 말이 없니?˝
˝나도 믈론 기뻐. 그런데 너, 할아버지가 왜 여기다 우리를 내놓았는지, 왜 우리 몸안에 샘물을 가득 부었는지 아니?˝
˝응, 알고 있어.˝
들꽃 항아리는 자기 몸을 어루만져 주시던 할아버지의 거칠면서도 따스했던 손을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여러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기억해 냈다.
˝나는 지금까지 도자기며 항아리 그릇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냈다. 내가 만든 그릇들은 그 모양이나 빛깔 또는 새겨진 무늬가 훌륭하다 하여 숱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그것들은 반드시 높은 대감님이나 임금님이 쓰시던 물건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다. 내가 진정 만들고 싶었던 것은 그 안에서 향기가 우러나오는 그릇이었다. 그 안에 담긴 음식을 향기롭게 하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해 주는 신비한 향기가 우러나오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나의 가장 크고 오랜 소망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이 두 술항아리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그릇이 될 것이다. 진짜란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법이니까.˝
들꽃 항아리는 새삼스럽게 가슴이 설레었다.
´우리 둘 가운데 하나가 향기가 우러나오는 항아리가 된다. 내가 그런 항아리가 될 수 있다면…….´
그때 대나무가 그려진 항아리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너도 들었지,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말이야. ´이 두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물맛을 보면 어느 것이 내가 만들려고 했던 진짜 항아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응, 나도 기억하고 있어.˝
˝내가 환한 햇살 아래 처음 나왔을 때 뭘 느꼈는지 아니?˝
˝뭘 느꼈는데?˝
˝난 말야, 내가 틀림없이 향기가 우러나오는 항아리가 될 거라는 느낌을 가졌어. 아니, 난 꼭 그런 항아리가 될 거야.˝
들꽃 항아리는 대나무 항아리의 말이 조금도 거만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싱싱하고 듬직하게 들리는 데에 놀랐다.
´그래, 맞았어. 나는 아니야. 네가 틀림없이 향기가 우러나오는 항아리가 될 거야. 반드 시…….´
햇살이 나날이 뜨거워져 갔다. 초록 잎사귀도 나날이 짙푸르러졌다. 신기슭에 놓인 두 항아리도 탈 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아니, 자세히 보면 약간 달라진 것이 있었다.
들꽃 항아리의 물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 목마른 산짐승이나 날짐승, 때로 나뭇꾼이 물을 청하면 서슴지 않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나무 항아리에는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초여름 오후 어느 날, 대나무 항아리가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넌 내가 매정하다고 생각하니? 아무에게도 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야.˝
˝아니. 난 네가 물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누구나 자기가 만들 어진 대로 살아야 하니까. 넌 나보다 훌륭해…….˝
˝글쎄, 훌륭하다기 보다는 생각이 다른 것 뿐이야. 난 흠 하나 없이 고귀하게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깨져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지. 이도저도 아닌 평범한 것은 싫어.˝
대나무 항아리의 울림은 크고 아름다웠다.
˝그럼, 너의 바람은 향기가 우러나오는 술항아리가 되는 것이겠구나.˝
˝바람? 바람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넌……?˝
˝난 이대로 있는 게 좋아. 목마른 누군가에게 물을 나누어 주며 그냥 살고 싶어. 그리고 오 래도록…….˝
무엇보다도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들꽃 항아리는 말을 그쳤다.
´오래도록 너와 함께 있었음 하는 게 내 커다란 바람이야.´
또 날이 흘렀다. 뜨거운 햇살에 하늘빛이 흐릿해졌다. 땅에서는 뿌연 먼지가 풀풀 일고 개울물도 말라 버렸다. 들꽃 항아리에게는 물이 한 방울도 안남았다. 대나무 항아리에게는 절반 가량 물이 남아 있었다.
˝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마치 해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활활활 태우고 있는 것만 같아.˝
˝네 몸에 물이 없어서 더욱 괴로울거야. 미안하구나. 나 혼자만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 서……. 네가 아파하니까 나까지도 힘들다. 하지만 너 알지? 내 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는 거…….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 줘야 해. 내 몸속에서 향기가 우러 나온다는 것을……. 우러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 모든 귀중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말이야.˝
˝알아, 나는 네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넌 반드시 향기가 우러나오는 술 항아리가 될 거야.˝
들꽃 항아리는 진심으로 소리쳤다.
언제까지나 지치지 않을 듯하던 뜨거운 햇살도 차츰 식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푸른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비가 내렸다. 며칠동안 계속 내렸다.
비가 그친 뒤의 하늘은 눈이 새콤해지는 쪽빛이었다. 나뭇잎들은 이제 감빛으로 물들기 시 작했다.
˝계절이 바뀐다는 건 참 아름답지?˝
˝응, 머지않아 겨울이 되겠지. 그리고 봄, 봄이 오면 사람들이 알게 될거야. 내가, 향기가 우러나오는 신비한 항아리가 되는 것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도 날 임금님께 갖다 바칠거야. 넌 어디로 갔음 좋겠니?˝
˝난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 내 몸 가득히 물을 담아 놓고 목마른 누군가에게 물을 나누어 주며 살고 싶어. 네 생각을 하면서.˝
바람이 휘몰아쳤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다. 산기슭 들꽃 항아리는
반쯤 채워진 채로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맞았다.
˝얘, 오늘 밤 무척 춥지?˝
˝응, 춥고 불안해.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다. 이런 느낌 처음이야. 난 언제나 자신 있었는데…….˝
˝아마 추위 때문일 거야. 우린 지난 여름 그 뜨겁던 햇살도 견뎌 냈잖아? 곧 봄이 오겠지. 네 꿈도 이루어지고…….˝
˝꿈? 그래 내게는 꿈이 있었어. 향기가 우러나오는 신비한 항아리가 되는 꿈.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일까? 아무리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신비한 항아리라도 우린 결국 어느 날엔가는 깨져야 하는 항아리일 뿐인데…….˝
그 날 새벽 모든 것이 꽁꽁 얼어 쥐 죽은 듯 고요한 산기슭에서 ˝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물이 가득 찬 채 얼어붙은 대나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다.
하늘이 새파래졌다. 다시 봄이 왔다. 아름다운 봄이었지만 들꽃 항아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깨진 대나무 항아리만 생각하고 있었다.
촉촉한 봄비가 살짝 내렸다. 그 날 밤 유난히 밝은 달이 둥실 떠 올랐다. 달빛을 밟으며 산기슭에 젊은이 둘이 나타났다.
˝저기 있네. 스승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신비한 항아리가.˝
˝그런데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
˝하나는 깨져 버렸어. 이 항아리가 진짜면 좋으련만, 어디 물맛이나 보세.˝
˝여, 여보게, 이게 진짜야. 어서 이 물을 떠 마셔 봐. 그저 놀랍네.˝
˝과연 신비한 물이군. 정신이 확 드는 듯 해.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군. 이 신비한 맛을…….˝
˝자, 이럴 게 아니라 이걸 산 속에다 옮겨 두세. 우리 둘이서 임금님께 갖다 바치면 후한 상을 받게 될 걸세.˝
그제서야 들꽃 항아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고는 놀랐다. 그러나 이미 자신은 두사람의 손에 들려 산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조심해 걷게. 길이 미끄러우니까.˝
얼마쯤 더 올라갔을 때였다. ´아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는 아래로 굴렀다. 물이 쏟아지고 항아리는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깨졌다. 깨지는 마지막 순간 들꽃 항아리는 생각했다.
´오히려 잘 된 일인지도 몰라. 난 향기가 우러나오는 항아리는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다만 목이 마른 누군가에게 가끔 물을 나누어 주는 꿈을 가졌었는데…….´
다시 세월이 덧없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다. 들꽃 항아리가 구르면서 속에 담긴 물이 쏟아졌던 그 산 속에 하얗고 작은 꽃이 피었다. 자그맣고 예쁜 그 꽃은 해마다 다소곳이 피어났고, 어쩌다 그곳을 찾아오는 벙어리 머슴에게, 외로운 나뭇꾼에게, 주인 아가씨보다 예쁜 계집종에게 기쁨을 느께게 해 주었다. 서럽고 지친 가슴들에게 샘물처럼 맑은 기쁨을 주면서 그 꽃은 해마다 피고 지고 또 피었다.
⊙강숙인 선생님은 소년중앙문학상과 계몽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어린이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은책으로는 <눈새><동화 속의 거울><우레와 꽃씨> 등이 있습니다.
⊙이 동화는 한국어린이교육 연구원에서 출판한 -고학년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