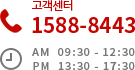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광일(광주매일)2003년 신춘문예당선작 |  | |
| 명산분교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였습니다. 학교 앞을 흐르는 개울 건너편 산기슭엔 옹기종기 버섯무리 같은 명산 마을이 있습니다.
명산분교는 학생수가 열 명밖에 안됐지만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걸어다니기보다 뛰어 다니는 게 몸에 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되자 학교는 잠이 든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학교 언덕에 비스듬히 선 느티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선생님만 보였습니다. 일년후면 정년퇴직을 하실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선생님은 허리를 일으켜 손을 높이 흔들었습니다.
명산리 아이들은 나이 차이가 났지만 모두 함께 놀았습니다. 물론 학교에 갈 때나 올 때도 몰려다녔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특히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혜숙이를 잘 보살폈습니다.
아이들은 개울에 나가 다슬기도 잡고 송사리 떼도 쫓았습니다. 그러다 개울 아래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에 싫증이 나면 산이나 경사진 논길을 뛰며 메뚜기를 잡았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재미있게 놀았지만 가끔은 도시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꼬마대장 격인 6학년 경식이가 풀밭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곁을 뒹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멋진 롤러브레이드도 타고, 놀이동산에도 실컷 가고.”
푸념 섞인 아이들의 이야기에 경식이는 얼른 했던 말을 주워담았습니다.
“우리도 재미있게 놀면 돼. 놀이동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자, 잔디썰매 타자.”
경식이가 미끄럼을 타며 풀밭을 내려갔습니다. 뒤따른 아이들이 고꾸라지며 뒤엉켰습니다. 이렇게 놀다보면 긴 여름해도 금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루는 숲을 헤치며 놀다 1학년 막내둥이 혜숙이가 외쳤습니다.
“새끼 새다.”
태어난 지 며칠 안돼 보이는 새끼 새가 둥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새끼 새는 눈도 못 뜬 채 버둥댔습니다.
“어, 여기에도 있다.”
경숙이가 가시덤불 속에서 허우적대는 또다른 새끼 새를 찾아냈습니다.
“새끼인데 무지 크다.”
“봉황새가 아닐까?”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와아, 봉황새? 가져가자.”
“그래, 우리들이 키워보는 거야.”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안돼!”
혜숙이가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혜숙이는 다리를 비척이며 새끼 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숙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왜 안돼? 우리 아빠한테 새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키울 거야.”
성우가 혜숙이를 밀치려하자 경식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미 새가 놀랄 거야. 너희들 혜숙이 잃어버려서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 나선 거 기억 안나?”
두어해 전 혜숙이는 혼자 들에 나갔다가 도랑 풀숲에 넘어져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혜숙이를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해가 지도록 찾았던 기억을 잊을 리 없습니다.
경식이가 조심스럽게 새끼 새들을 둥지로 옮겨 주었습니다. 혜숙이는 두 손으로 눈을 훔치고 다른 아이들은 멋적게 지켜만 보았습니다. 안전한 둥지 속에서 새끼 새 두 마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째째 거렸습니다.
“얘들아, 샛골에 가재 잡으러 가자.”
경식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샛골로 달렸습니다. 혜숙이도 경숙이 손을 잡고 뒤뚱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방학은 짧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온통 새까맣게 태워버린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개학날 선생님은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에취! 어서 오너라. 콜록콜록! 여름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선생님이 감기에 걸렸지 뭐냐. 허허허.”
선생님은 아이들의 등을 하나하나 두들겨 주었습니다.
“자, 숙제는 교탁 위에 올려라. 콜록콜록.”
방학숙제는 곤충채집과 식물채집, 그리고 일기였습니다. 선생님은 숙제보다 방학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방학동안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해보자.”
혜숙이부터 차례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졸으신 적은 있지만 아침부터 이러신 적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감기 약에 취하신 거 아닐까?”
경식이가 아이들을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리리리릭-.”
“휘파람새...”
혜숙이가 소리치자 경숙이가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선생님 깨신다.”
아이들은 모두 창가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머리 위로 눈부시게 빛나는 은빛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가오리연처럼 길다란 노란 꽁지가 펄럭였습니다. 휘파람 소리는 물에 젖어드는 스펀지같이 마음에 스몄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솜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열린 창을 빠져나가 둥둥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어...올라간다.”
“와아 우리가 난다.”
아이들은 천천히 하늘로 올랐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아이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학교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신기해진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어, 저기 봐. 혜숙이 아빠가 논에 서 계신다.”
“어, 이장님도 경운기랑 함께 서버렸네.”
“그대로 멈춰라 게임인가 봐. 모두 멈췄어.”
바람결에 흔들리던 나뭇잎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노란꽁지새는 앞서 날며 휘파람 소리를 내었습니다. 높은 음이 나면 아이들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할 때도 음색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휘파람 소리가 작아지고 낮아지면서 어느 골짜기에 닿았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동생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와아. 작년에 서울서 가본 놀이동산 보다 더 재미있어.”
아이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 노란꽁지새는 보이지 않고 숲 속엔 하얀 도화지 길이 열렸습니다. 군데군데 커다란 색연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선이가 가장 먼저 색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와, 이런 색연필은 처음 봐.”
쭈뼛거리던 아이들도 선이를 뒤따라 색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난 꽃을 가장 좋아하는 데...”
선이가 노란 꽃 한 송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어, 진짜 꽃이 되었어.”
아이들은 흠흠 거리며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야아. 그럼 우리도 그려보자.”
“난 롤러브레이드.”
“낫 맛있는 과자.”
“와아, 그림이 모두 진짜로 바뀌었어.”
현수는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달렸습니다. 성우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초콜릿을 좋아하는 경숙이는 초콜릿만 실컷 먹었습니다. 혜숙이는 자전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탈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왠지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혜숙아, 자전거 내가 그릴게. 언니가 태워 줄게.”
다리가 불편한 혜숙이를 위해 경숙이가 얼른 다가와서 색연필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내가 그려서 타 볼 거야.”
혜숙이는 다시 색연필을 잡고 자전거를 그렸습니다. 혜숙이는 자전거에 가만히 올랐습니다. 자그마한 자전거는 기우뚱거리지도 않고 혜숙이를 잘 받쳐주었습니다. 혜숙이는 천천히 페달을 밟아 보았습니다.
“언니! 간다! 자전거가 간다!”
“와아, 우리 혜숙이 잘 탄다!”
경숙이도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혜숙이 대단한데.”
혜숙이는 하얀 도화지 길을 마음껏 달렸습니다. 푸르른 숲 속 이파리들도 한꺼번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이가 커다란 집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등받이가 우아한 소파에 앉아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이가 식탁에 그린 온갖 과자와 치킨, 햄버거도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야지.”
과자를 주머니에 넣으며 현수가 말했습니다.
“집에?”
그 말에 모두들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깨어나셨다면 우릴 찾느라 야단나셨을 거야.”
“얼른 돌아가자.”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모두 손에 든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과자들을 내려놓고, 게임을 멈추었습니다.
“어서 가자.”
“그래, 오빠.”
“그래, 형.”
경식이를 향해 밀물처럼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가긴 가야하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 줄을 알아야지.”
주변을 둘러보며 경식이는 뒷머리만 긁적였습니다.
“휘리리리리...”
그 때 다시 휘파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마.”
아이들은 모두 목소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경식이는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우리를 돌려 보내줘요.”
목소리는 하얀 도화지 길옆 팽나무 위에서 났습니다. 그곳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노란꽁지새와 또 다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린 너희가 며칠 전에 구해준 새끼 새들의 부모란다.”
“아니, 그럼 혜숙이가 발견했던...”
아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고마웠다. 특히 혜숙이, 경식이 정말 고맙다.”
노란꽁지새들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 세상에서 노란꽁지새는 우리밖에 남지 않았단다.”
아이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들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 줄게. 우린 너희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 번 더 이곳에 올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 둘을 구해줬으니 너희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란다. 우리를 부르는 방법은 `노란꽁지새야! 준비 됐어.´라고 하면 돼. 그러면 곧 달려갈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된단다.”
“알았어요. 와아, 또 올 수 있대.”
모두들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자전거를 실컷 타서 볼이 발그레진 혜숙이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그래, 혜숙이 너에게 자전거를 타게 해 주고 싶었단다.”
노란꽁지새의 깃털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자, 애들아 색연필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렴.”
노란꽁지새의 말에 아이들은 색연필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다 지워지고 처음처럼 하얀 도화지 길이 되었습니다.
“휘리리리리...”
노란꽁지새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몸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 아래 있던 하얀 길이 아이들이 떠오르는 것과 함께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논이나 길에 꼼짝 않고 서있던 어른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사뿐히 내려앉아 교실을 엿보니 선생님은 아직 졸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이 일은 모두 비밀이야.”
“응.”
아이들은 눈짓으로 약속을 하며 살며시 교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발표 차례였던 선이가 선생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익산 큰댁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시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엉, 익산이라. 그래. 그래. 하하.”
선이가 익산 큰댁에 가서 사촌들이랑 놀았던 일을 이야기 할 때 아이들은 고개를 떨구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교탁을 치며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이 녀석들, 발표하는데 졸다니...”
아이들은 고개를 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선생님 몰래 경식이가 아이들에게 눈을 찡긋하였습니다.
여전히 즐거운 현수는 주머니에 든 과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경숙이 입가엔 초콜릿이 낙서처럼 묻어 있었고, 혜숙이는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발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길이 아직도 아이들 마음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