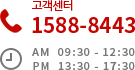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나의 자줏빛 소파 |  | |
| 조경란 : <나의 자줏빛 소파>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 출판일 : 2000/5/12 / 쪽수 : 328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의 자줏빛 소파´는 매우 은유적인 제목을 갖고 있다. 사회적으로 별 보잘것없는 여주인공이 혼자에서 벗어나고 남과 소통하기 위해 수신자가 모호한 편지교환 클럽에 띄우는 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서신이 펼쳐진다. 지목할 특정 수신인을 갖지 못한 사람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편지글 형식을 신선하게 활용하고 있다. 꼬집어 말할 큰 줄거리 없이 주인공의 소소한 주변 잡담이 이어지는 것이 고독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래서 ´웬 소파고 왜 자줏빛인가´라고 묻지 않는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감지되는 것이다. 단순한 팬시명함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있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사물들과 삶의 주변에 대해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듯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고독과 우수를 표출하고 있다. 갈수록 건조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라는 단자화된 존재들의 소통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발견하려는 몸짓들이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주인공 여자는 세상의 모퉁이에 유폐된 쓸쓸한 존재. 그녀는 도심의 서점 한구석에서 즉석명함을 만들어주는 점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한 뒤 뜨개질로 소일한다. 여기에서 명함이란, 현대사회의 기호화된 인간들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찾아올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 명함을 제작하는 한 남자에게 그녀는 사소하게 매혹 당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만날 수 없는 그 남자의 옷을 뜨개질하지만 ´접속´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여자는 허망한 희망을 접고 남자를 위해 짜던 스웨터의 털실을 풀어 불에 그을려진 자신의 단벌 겨울 외투를 손질한다. 자존의 외피를 더 단단히 감싸는 길밖에 세상의 고통에서 좌절 한 사람의 상처를 달랠 방법인 것 같다. 그 남자는 매일 이름을 바꾸는 도시의 떠돌이일 뿐이다. 익명성의 한가운데에 섬처럼 떠있는 현대사회 인간들의 존재조건에 대해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시선은 ´녹색 광선´에도 비슷하다. 이 단편의 주인공 남자는 공장에서 해고된 뒤 술에 의식을 놓아버렸다가 겨우 혼자 사는 집에 찾아들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다. 동거하던 여자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버렸고, 단수로 인해 집안에는 썩는 냄새가 엄습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집안에 살아 있는 단 하나의 생물체가 아니라 실내를 가득 채운 썩은 냄새의 일부가 아닐까 의혹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 모든 썩어가는 풍경을 비추는 햇살 한 오라기가 있다. 미세한 희망을 여기에 걸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집을 비웠을 때 열어놓았던 수도꼭지들에서 갑자기 콸콸 흘러나온 물로 인해 집안이 썩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 저수지가 됐을 때, 희망은 새삼스럽게 비관적인 풍경에 압도돼 버린다. ´물´이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되는 그것이란 억압과 조롱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소설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내적으로 고독하고 외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빠져 있다. 어둠이나 그늘과 더 친한 이들은 본능적으로 빛과 햇볕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들이 갈구하는 빛은 혼자만의 고독에서 벗어나고 타인과 원만히 소통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렸거나 잃고 있는 그 무엇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그 눈을 통해 살아가는 의미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지럽고 복잡한 인간 관계에서도 작으나마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