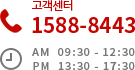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최정례의 ´붉은 밭´ / 이기인 |  | |
|
(시인이 시인에게)
최정례의‘붉은 밭’ / 시인 이기인
서울에서 3시간 남짓 굴러간 바퀴는 아담한 소쩍새 마을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리둥절한 한 나뭇가지에 앉아 날개를 접었다 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한낮의 부엉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곧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렸던 연꽃방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때, 연꽃방 못난이 삼형제의 맏형 희진이가 찡그린 얼굴로 나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으, 으 안녕해요”. 희진이는 소쩍새 마을에서 장기와 오목을 가장 잘 둔다는 뇌성마비 명훈이를 이기고서 이제 막 끌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최정례 시인의 시 ‘두 사람의 잠’에서 말했던 ‘나는 몸을 구부리고 나는 벌거벗은 돌멩이가 되려고 한다’ 했던 행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희진이를 놀렸습니다. “와, 희진이가 명훈이를 이겼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부네”.
연꽃방에서 희진이가 웃는 모습은 몇년 전 중광이 즐겨 그렸던 그림 한 폭 같았습니다. 희진이가 반가워서 나에게 뭐라고 떠듬거리는 모습은 한 줄기 노오란 해바라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른 고개를 쭈욱 뽑았습니다. “으, 으, 나도 네가 증말 보고 싶, 었, 어”.
치악산 자락에서 붉어진 잎들은 소쩍새 마을로 점점 내려오다 몇몇 봉사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이들은 왜 상원사나 영원사로 가서 소원을 빌지 않고 왜 이쪽으로 들어왔을까.
´깜박 잠이 들었나 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푸른 골짜기 사이 붉은 밭을 보았습니다 고랑 따라 부드럽게 구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풀 한 포기 없었습니다 그러곤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거길 지날 때마다 유심히 살폈는데 그 밭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붉은 밭’에서)
나는 묘전 스님을 뵙고 은행나무에서 여럿 천사들과 놀았습니다. “아찌 왜 왔었어”, “아찌 이름이 모야”, “이거 이쁘지”, 천사들의 동그란 입 모양을 살피다 누군가 입혀준 옷이 이쁘기만 하여서 그 맘을 써준 봉사자의 마음을 한 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때, 한 여인이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와서 일곱 살 아이처럼 떼를 부렸습니다. “아찌 이름이 모야, 다음에 올 때 나 반지 하나만 해줄래”. 그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약속’. 마흔살쯤 먹은 그녀는 금방 붉은 밭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교과서를 아궁이에 쳐넣었습니다 학교 같은 건 다녀 뭐하냐고 했습니다 나는 아궁이를 뒤져 가장자리가 검게 구불거리는 책을 싸들고 한 학기동안 학교에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붉은 밭’에서)
몸이 불편타 하여 하루종일 누워서 욕창과 싸워야 하는 소년이 창문 쪽으로 드디어 몸을 비틀었습니다. 나는 지금 소년이 누워있는 붉은 밭을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근래 읽은 최정례 시인의 ‘붉은 밭’이란 시집 제목을 떠올립니다. ‘타다만 책가방’이 아니라, 타다만 것 같은 그네들의 육체가 완성해 놓은 기쁨이란, 과연 무엇인가. ‘가끔 한밤중에 깨어보면 내가 붉은 밭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몸을 뒤척거리면서 잠을 기다립니다. 별을 땁니다. 내 손이 별을 만질 수는 있는 것인지. 욕창에서 뻗어나온 손을 꼬옥 잡아준 일은 있었는지. 내 작은 손바닥을 붉은 밭에 파묻어 봅니다.
<출처: 2001/10/30 경향신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