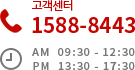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나 이뻐? |  | |
| 착하고, 약한 듯 강하고, 눈물 많고, 자기가 예쁜 줄 모르는 예쁜이들
오래 전 밀란 쿤데라가 랭보의 시구절에서 착안해 썼다는 「생은 다른 곳에」(안정효 옮김, 까치글방)라는 소설을 읽고 묘한 상념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 ‘다른 곳’이라는 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늘 현실의 상궤 안에서만 반복되는 ‘생’이 현실에는 없는 ‘다른 곳’에 존재한다면 삶은 늘 그 짓궂고도 오묘한 아이러니 속에서 지리한 반복을 거듭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생’이나 ‘다른 곳’,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생’은 몽땅 허구에 불과하다. 현실의 누추한 삶에게 보복하려는 환상의 산물이 현실의 삶을 더욱 궁여지책으로 몰고 가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 그런 생각에 함몰되는 순간, 무척이나 살기가 싫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도리스 되리의 단편집 「나 이뻐?」에는 표제만큼이나 깜찍한 17편의 단편이 실려있다. 거두절미하고 단박에 이야기의 핵심만을 보여주는 묘사와 속도감 있는 문체가 독특한 매력으로 읽히지만, 한편 한편 연극무대의 막이 내리듯 종결되는 작품들의 뒷맛은 애초의 깜찍함을 끔찍함으로 돌변케 한다. 그러나 그 끔찍함은 생의 비극적인 일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마음을 쿡쿡 짓누르는 현실고발적인 게 아니다. 도리스 되리는 익숙하고 지리멸렬한 삶의 표면들을 명징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열정과 자유와 희망을 억압하는지를 허기에 취해 덥썩 배어 문 크림빵조각처럼 상큼하게 스며들게 한다. 실연한 여인이 슬픔을 달래려 칼로리 함량 무시하고 허겁지겁 빵을 먹어대는 순간, 침대맡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예쁜 빵 봉지마저 비극의 데코레이션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도리스 되리가 그려내는 비극은 비극이라는 표현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일상적이다. 그 밋밋한 듯하면서도 치명적으로 마음을 들쑤시는 비애감은 슬픔에 지친 여인이 잠든 사이, 슬금슬금 기어 나와 여인이 먹다 남긴 빵을 핥는 고양이처럼 삶의 요소요소에 잠복해 있다. 도리스 되리는 마치 우리에게 ‘지금, 위험한 고양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하다. 물론 고양이는 하나의 은유일 뿐이다. 그건 ‘이곳’의 생이 끊을 수 없는 식후 담배 한 모금처럼 반복해서 꿈꾸는 ‘다른 곳’의 유혹자를 상징한다.
희극과 비극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는 삶의 위태로운 정열을 도발하며 우리를 지켜보는 고양이의 눈동자. 그러나 도리스 되리의 고양이는 보들레르나 포가 그려냈던 식의 신비와 우울한 관능으로 넘쳐나지 않는다. 슬픔과 비애의 절정에서 한순간 꼬리를 튕기며 푸른 하늘의 예쁜 구름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탄력. 도리스 되리의 인물들은 나른한 대낮의 배부른 암코양이를 닮았다. 그래서일까. 순전히 개인적인 감상에 불과하지만, 「나 이뻐?」에 실린 작품들을 읽으면서 시인과 촌장이 예전에 불렀던 개성만점의 노래 〈고양이〉가 떠올랐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랬었다. ‘높은 곳에서 춤춰도 넘어지지 않는, 그 아픔 없는 눈, 슬픔 없는 꼬리, 너무너무 좋을 테지∼’
수록된 17편의 단편들은 모두 여자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 당연히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실의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지만, 그녀들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 다름 아닌 ‘동경’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작품마다 등장하는 여인들은 사랑하는 남자(로 대표되는 욕망과 자기만족의 대상들)를 동경하고 거기에 상처 입으며, 그 상처를 바탕으로 삶의 끈질긴 내구력을 키운다. 그 과정엔 슬픔과 비애뿐 아니라, 모순투성이의 현실과 부딪쳐 반짝반짝 빛을 내는 익살과 유머가 싱싱하다. 인간의 감정을 칼로 나누듯 선명하게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도리스 되리가 곤경에 처한 인물들에게서 유머를 이끌어내는 건 삶의 내재적인 원리와 질서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그만큼 도리스 되리의 단편들은 짧은 상황과 단순한 구성 속에 응축시켜놓은삶에 대한 사려 깊은 성찰이 빛난다.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들고 꽉 쥐어짜지는 않으면서도 뼈 시리도록 강한 공감을 이끌어내지만, 삶에 대해 그리고 사랑과 동경에 대해 아무런 사변이나 변증도 하지 않는 깔끔담백깜찍한 소설들. 거기에 비하면 이 글은 얼마나 궁색하고 너저분한가.
그렇더라도 꼭 부기해야 할 사항이 있다. 테크노 힙합 전사 같은 이미지의 흑인 오르페오가 사랑의 메신저로 나왔던 독일 영화 〈파니 핑크〉의 감독이 바로 도리스 되리다. 그 영화를 보고 힘을 얻었거나,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거나, 기어이 연인을 만나 키스를 하면서 암울한 청춘을 가둔 궤짝 같은 관을 창 밖으로 던지던 주인공의 행운에 열렬히 박수를 쳤다거나, 그 장면에서 흘러나온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난 아무 것도 후회하지 않아〉를 듣고 세상의 빛깔이 다르게 느껴졌다거나 한 분들(특히 서른 안팎의 여성분들)에게 이 책을 강하게 추천한다. 원제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Keiner liebt mich)’인 그 영화는 바로 ‘다른 생’을 찾다가 ‘자기 앞의 생’을 교통사고처럼 깨닫게 된 도리스 되리적 스토리라인의 전형이니까. 참고로 남자인 나도 그 영화는 네 번이나 봤다, 혼자 키득거리고 찔끔거리기를 수 차례 반복하면서. (강정 igguas@libro.co.kr/리브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