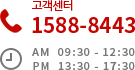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첫 커피의 추억 /아름다운 일상 |  | |
| [함민복]
용두동 형 방에 갔다. 우겨 자면 잘 수도 있겠으나 불편할 것 같아 집을 나왔다.
작업복 한 벌, 책 몇 권, 체육복 한 벌, 쌍절곤 하나가 든 체크 무늬 트렁크를 들고 서울역에 내렸다.
밤 아홉시. 대우빌딩 쪽으로 길을 건너갔다.
서점으로 들어갔다. 책을 한 권 사 읽으며 밤샘을 하자는 결심을 굳혔다.
문학사상」을 샀다. 두 시간 반만 지나면 통행금지가 될 것이다.
서울역 대합실은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싸구려 트렁크를 든 교복 입은 학생을
화장실 거울 속에서 만나, 한참 면접을 보았다. 대합실 안 의자 하나를 잡고 앉았다.
문학지에 실린 시를 먼저 읽고 소설을 천천히 읽었다. 문학지에 실린 소설을 처음 읽은 것은 중학교
때였다. 국수틀집(기계로 국수 가닥을 가늘고 길게 뽑아 나무틀에 걸어 말린 다음 자른 국수 다발을
팔던 집)을 하던 인섭이네 집에서였다. 인섭이도 공부를 잘했고 나도 공부를 잘하는 축이어서 공부
한다고 인섭이 방에 가면 인섭이 어머니가 먹을 것을 갖다 주시기도 했다. 우리들은 주로 공부보다
여학생 중 누가 더 예쁜가를 속닥였다. 여학생들이 예뻐졌다 말았다 하다가 인섭이가 잠들면 나는 할
일이 없어져 학생백과사전을 읽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학지에 실린 소설을 읽어보았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간내기가 아닌 사람들의 삶에 재미를 느꼈다. 인섭이 아버지는 신경림 시인과 문학 공부를
같이하시던 고향 친구분이다. 그래서 문학지가 있었던 것 같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다. 제복 입은 사람들이 대합실 바깥으로 사람들을 내쫓고 있었다.
아득해졌다. 대합실에서 밤을 보낼 수 없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대합실에서 쫓겨나 나는 먼저 돈을 헤아려보았다. 발전소 가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라고 학교에서 준
왕복 차비 이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여관에서 잘 수도 없는 일이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난감했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자 질주하는 차소리는 더 거칠어졌다.
2학년 때 문학지에 소설을 부치러 가며 보았던 우체국 옆 파출소가 떠올랐다. 교복을 입고 트렁크를 든
내가 파출소로 들어가자 경찰 아저씨들이 멀뚱히 쳐다보았다. 학생인데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만 있을 수 없냐고 부탁드려보았다.
“학생 같은 사람들 하루 수백 명씩 와. 안 돼.”
통사정을 해도 먹히지 않아 파출소 문을 나섰다. 나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여러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형 집에서 그냥 잘걸 하는 후회가 일었다.
“학생 잘 데가 없어서 그러지?”
덩치가 왜소한 젊은 청년이 말을 붙여왔다.
“겁먹을 일은 없고. 나도 시골 사람이야. 서울 와 살면서 뭐 좋은 일 하며 살 게 없을까 생각해보았는데
대단한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 방이 크니까 잘 데 없는 사람들이나 재워주면 되겠다 싶어 이렇게 나왔
어. 가서 편히 자고 가라고. 염려하지 말고. 미안할 것 없어.
학생도 이 다음에 좋은 일 하며 살면 되지 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싫었다. 내 행색을 빨리 파악하고 나도 시골 사람이란 말을 건넨 저의가
의심스럽기도 했다. 또 트렁크 깊이 감춰둔 차비를 만약 빼앗긴다면 하는 걱정이 앞섰다.
“잠자는 데 천 원.”
구세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 원을 주기로 하고 아줌마 뒤를 따랐다. 나 외에도 할머니 한 분과 청년
한 명이 아줌마 뒤를 따랐다.
“학생 큰일날 뻔했어. 아까 그 사람 호모여. 따라갔으면 잠 한숨 못 잘 뻔했어.
밤만 되면 매일 나오는걸.”
아줌마를 따라 세 사람이 들어선 방은 관짝 하나 크기에 광만 한 뼘 정도 넓을 뿐이었다. 세 사람 전부
상상했던 것보다 방이 작다는 실망의 눈치였으나 그도 잠시 그래도 몸을 앉혀 쉴 수 있다는 안도감에
적이 안색이 밝아졌다.
청년이 벽 안쪽에 기대앉으며 자리를 잡았고 할머니와 나는 지그재그로 거리를 두고 마주 보며 자리를
잡았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할머니였다.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 고생이 많구만. 하긴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지만 방이 좁아도 너무 좁아 다리를
펼 수가 있어야지. 나도 늙은이가 사서 고생이지 아들한테 연락만 하고 올라왔어도. 우리 아들들은 다
택택하게 잘사는데….”
무릎 위에 올려놓은 보따리를 붙들고 주절주절 말하는 할머니의 반지에서 간난의 냄새가 났다.
할머니 집에 가면 반지 냄새가 온 집안 가득 퍼져 있을 것 같았다.
벽에 기대앉아 있던 청년이 무심결에 윗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다. 청년의 팔뚝에
담뱃불 자국이 있었다.
“우리 아들은 합기도 사범이야. 몸이 이렇게 좋아.”
나는 할머니가 왜 그 순간에 아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청년이 모로 누워 몸을 구부렸다.
나는 트렁크 배를 쫙 열고 책을 꺼내는 척하며 내용물들을 꺼내 보였다. 작업복과 체육복 외에 별다른 것
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취미로 오래 달고 다니는 쌍절곤도 보여주고 싶었다. 쌍절
곤 쇠사슬 소리가 나자 청년이 눈씨를 주었다.
“아, 이거요. 저도 할머니 아드님처럼 운동을 좋아해서요.”
청년은 가늘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할머니는 세운 무릎에 보따리를 끼고 졸았다. 나는 문학지를
넘기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 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서 방학이 없고 전교생이 다 한전으로 실습을 나가야 했다. 일학년
여름방학 때는 전공과 관계없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실습을 나가라고 하여 충주 변전소로 실습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시골 가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다가 청계천 헌책방에 가 문학지
50권을 5천 원에 사 싸들고 내려가 방학내 읽은 적이 있다.
깜박 졸다 눈을 뜨니 청년은 가고 없었다. 나는 돈을 확인해보려고 트렁크 지퍼를 열었다. 지퍼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깬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추슬렀다. 돈은 그대로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트렁크를 머리에 이고 서울역을 향해 뛰었다. 지폐와 만나면 침묵하는
동전이 저희들끼리 만나 주머니에서 짤랑짤랑댔다. 기차는 도회지를 빠져나와 들판을 지나고 거세진
빗줄기는 유리창을 때렸다.
유리창 아래 턱진 곳에 붙여놓은 트렁크를 보며 트렁크에 그려진 체크 무늬를 보며 나는 슬픔에 젖어
들었다. 죽겠어… 그래도 대학 가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더 있니…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고향 친구들과
나눈 편지도 떠올랐고 내가 사람들을 지독히 의심했던 어젯밤 일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빨리
취직해 내가 돈 벌어 부쳐야 할 고향 땅 노부모님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나는 창을 보고 소리없이
울었다.
얼마를 더 갔을까 마주 보는 의자에서 담소하던 신사 세 분이 역무원 아가씨에게 커피를 시키며 내
것도 한 잔 시켜주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리는 빗줄기를 보며 나는 따듯한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때 커피란 음식을 처음으로 마셔보았다.
[작은이야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