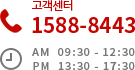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친구의 편지와 돼지고기 |  | |
| [유한나님]
선량한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활짝 웃던 4학년 때의 내 짝은 너무도 가난했다. 숭숭 구멍난 스웨터에선
보리알갱만한 이가 슬금슬금 기어다니곤 했다. 이가 있다는 것이 그리 큰 흠도 아니었던 때였기에 그래
도 우리는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가 팔로 공책을 가리고 무엇을 열심히 쓰고 있었다. 무엇을 쓰고 있는지 호기심이 발
동한 나는 살짝 빼앗아 읽었다.
하지만 이내 편지를 읽은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말았다. 내용은 서울로 돈벌러 간 오빠한테 쓴 편지였
다. 친구가 평소에 자랑삼아 말하기를 오빠는 서울 어느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 때가 여름이 마악 지나가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추석에 내려올 때 돼지고기 좀 사오라고는 오빠가 올
날만 기다린다’는 내용이었다. 그 시절엔 누구나 쉽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다. 된장찌
개에 돼지고기 몇점만 들어가도 맛이 확 달라지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던 때였다. 편지를 읽고나서 얼마
나 미안하던지 친구도 부끄러워 얼굴이 벌개졌고 나도 얼굴이 벌개져서 얼른 사과했다.
친구는 다른 아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내손을 끌어다가 새끼손가락을 꼭꼭 걸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네 집엔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익었을 때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라는 말 그
대로의 모습이였다. 누렇게 찌들고 구멍난 런닝셔츠를 입고 있던 친구 아버지의 점심은 먹다남은 꽁보리
밥 반그릇이었고 반찬은 된장 한가지였다. 나는 그렇게 초라하고 간단한 밥상을 본적은 그때가 처음이었
고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친구 어머니는 부엌에서 “손님이 왔는데 어쩌나 어쩌나”라는 말만 하
고 계셨다. 친구는 얼른 “괜찮아, 엄마! 오디 먹으러 왔는데 뭘.” 하면서 나를 데리고 집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언덕배기에 있는 뽕나무밭에 가서 뽕나무 열매인 오디로 배를 채우고 내려왔다. 꽁보리밥도 배불
리 먹지 못하던 친구는 돼지고기가 많이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나는 요즘도 정육점에 가서 싱싱한 돼지
고기를 보면 그 친구가 생각난다.
음식점에 가서 돼지고기 수육을 먹을 기회가 있을 때도 꼭 그 친구가 생각나서 죄를 짓는 기분으로 젓가
락이 가기 전에 순간 머뭇거려진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와져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육식을 기피하기까지 하지만, 참으로 가난했던 시절에 썼던 돼지고기에 대한 편지를 그 친구도 분명 기억
하고 있을 것이다. 그 편지를 짓궂게 빼앗아 읽었던 나까지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든지 착하고 순수했던 그 모습 잃어버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린다.
친구야! 그때는 정말 미안했고 사랑한다.
[월간 신앙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