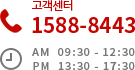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거의 모든 것의 역사 |  | |
| 과학 이야기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쉽게 쓴다. 천문학의 칼 세이건이나 생물학의 스티븐 제이 굴드가 그런 예다. 드물지만 문외한이 전문가 뺨치는 작품을 내놓기도 한다. 전문분야가 따로 없으니 거칠 것이 없고, 무엇보다 대중의 관심사를 호흡하기 때문이다.
빌 브라이슨은 미국과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여행작가다. 유머러스한 필치가 장기다. 과학과는 거리가 먼 그가 5년간의 취재를 통해 과학교양서에 도전했다. 무모하게도 그가 다룬 것은 과학의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역사이다. 입시부담에 쫓기기 전 중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법한 주제들, “지구 나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우주 끝의 밖에는 뭐가 있나” 따위가 이 책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인류의 탄생을 거쳐 다윈의 진화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초끈이론까지 다뤘다. 분량은 500쪽이 넘지만, 심심치 않게 웃음이 입가에 새어나온다. 비결이 뭘까.
무엇보다 이책은 과학에 앞서 사람 얘기다. 과학자는 근엄한 공식과 이론을 만드는 전형적 인물이 아니라, 경쟁자의 성공에 배아파하고 자기 연구결과에 우쭐대며 종종 괴벽을 가진 인물들로 묘사된다. 그는 다윈과 헉슬리의 동상을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외진 커피숍으로 밀어내고 중앙 홀 계단에 서 있는 리처드 오언의 동상을 용납하지 않는다. ‘공룡’이란 말을 만든 오언이 얼마나 속 좁고 악랄한 화석연구자였는지를 그는 사료를 뒤져 낱낱이 드러낸다. 그의 과학사에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공식 역사에 가려진 약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배어있다. 판 구조론의 원형인 대륙이동설을 주장한 알프레드 베게너가 지질학이 아닌 기상학자인데다 독일인이란 이유로 그의 탁월한 발상을 반세기 동안이나 애써 묵살한 동시대 지질학자들을 마음껏 야유한다.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미즐리는 휘발유 첨가제 사에틸납을 발명해 큰 돈을 번다. 당시 이미 제기된 중독위험을 애써 덮는 데 성공한 그는 이어 나중에 성층권 오존층 파괴로 악명높은 냉매 염화불화탄소를 발명해 돈방석에 앉는다. 브라이슨은 그가 결국 다리를 절게 됐고 침대에 누운 자신의 몸을 뒤척여 주는 장치를 개발해 쓰다가 엉켜버린 줄에 목이 감겨 질식사한다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통쾌한 인과응보다.
숫자와 이론을 일반인의 감수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책의 또다른 매력이다. 그는 큰 별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초신성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식탁 위에 소금 한 줌을 뿌렸을 때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은하라고 한다면, 그런 식탁 1500개를 월마트 주차장에 가득 채운 뒤 어느 한 식탁에 소금 알갱이를 하나 더 뿌리고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라는 식이다.
태양계는 또 얼마나 거대한가. 지도에 지구를 팥알 크기로 나타낸다면 목성은 300m 떨어진 곳에 있고 가장 바깥의 명왕성은 2.4㎞나 떨어져야 한다. 게다가 명왕성은 세균 크기라 보이지도 않는다.
사람의 평생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도 한다. 예상 밖으로 백만 단위가 아닌 고작 65만 시간이다. 비록 찰나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모두가 사실상 하나”인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사람이 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by http://www.yes24.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