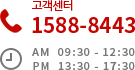|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  | |
|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1996)를 읽다.
이 책에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그의 속편 격인 <1973년의 핀볼> 두 개의 중편이 실려있다. 모든 작가의 처녀작은 그 작가의 향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내 지론인데, 하루키의 경우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하루키의 문제 설정이다. 그의 소설의 정점을 이룬 것이 <양을 쫓는 모험>이라고 생각하면 이 작품은 그 단초가 되는 지점이다. 이 소설에서는 특정한 사건이 두드러진다거나, 눈에 띠는 인물간의 갈등이 엿보이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소설을 해부하는 방법대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이 소설을 구분하기 위해 메스로 째고 핀셋으로 들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하루키 소설을 읽는 것이 그렇듯이, 그의 언어와의 싸움에 주목하면서 바람을 맞듯이 대책없이 읽는 것이 이 소설을 ´느끼는´ 방법이 되겠다.
무기력한 일상을 예리한 칼로 깨끗하게 잘라낸 단면. 이 소설에 대한 주관적 집약이다. 심각하지 않게 스쳐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고찰대신 하루키는 ´가벼움´을 택한 걸까? 혹은 그것이 그가 파악한 관계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다소 끔찍하지만 솔직한 생각도 든다)
이 소설에서 유난히 드러나는 하루키 특유의 문단 종결법. ´그것 뿐이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 것이다´, 등등. 눈에 거슬리면서도, 간단해서 한 편으론 맘에 든다. 잔뜩 인상을 구기는 것보다는, 시니컬한 냉소나 혹은 그것조차도 없이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것이 더욱 세련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세상의 허점인지, 나의 취향인지 모르겠다. 글세.....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재 이유 (레종 데르트)에 대해 76페이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피력한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궁금하다.
´모든 사물을 수치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타인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예전에 내가 집에서 고등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발걸음 수를 세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수치화한다는 것이 곧 솔직한 것이라 믿었던, 철이 없던 시절이었다. 결국 숫자가 너무 커서 헤아리는 것을 실패했지만 약 천 오백 걸음 정도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짓을 하면 누구나 외토리가 되거나 미친 놈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며, 현실이다)
|
|
|
|
|